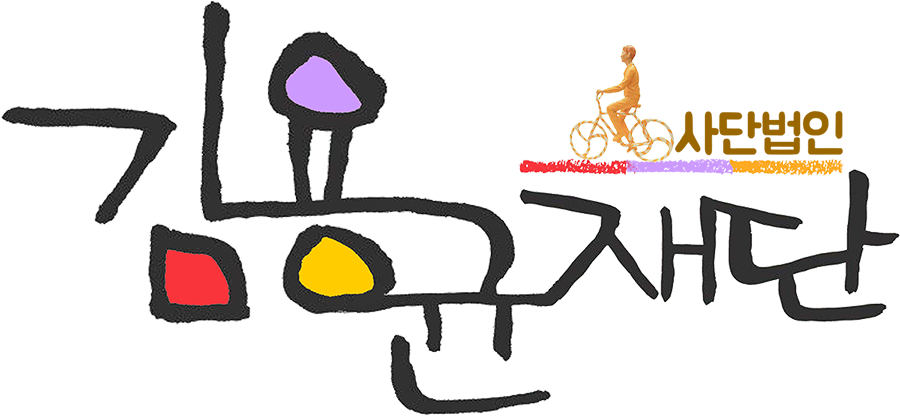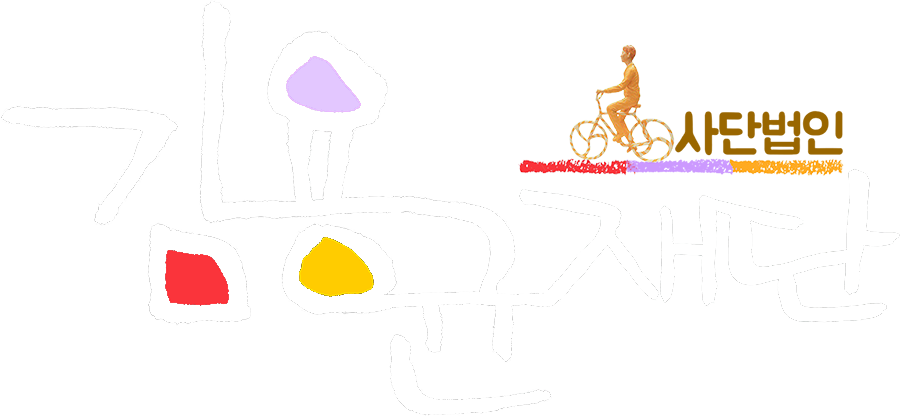김용균재단 청년기자단 1기 최보근 기자
사건개요
2022년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일용직노동자 I씨가 사망했다. I씨는 출입문의 높이를 확장하기 위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철근콘크리트를 절단하고 있었다. 2.1m인 문의 높이를 2.4m로 높이는 작업에서 259kg의 철근콘크리트가 한꺼번에 떨어졌다. 이 철근콘크리트가 이동식 비계를 쳤고, 이 충격으로 이동식 비계가 2m가량 튕겨 나갔다. 피해자 I씨는 중심을 잃고 1.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하청업체 C 법인과 대표, 현장소장이 기소됐다.
재판결과
1심 판결 일시: 2024년 8월 8일
| 하청업체 | |
|---|---|
| 법인 | 벌금 5천만 원 |
| 대표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 현장소장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춘천교육지원청 청사이전 신축 공사 현장
출처: 춘천사람들
사건 주요 지점
구두로만 전달된 위험한 작업 내용과 수차례 지적된 ‘이동식 비계’ 안전
“이동식비계 위에서 정상적인 작업방법(일정한 간격, 깊이로, 절단기로 콘크리트 줄긋기 후 핸드브레이커로 철근 파쇄 등)과 달리 위 벽체를 상부, 좌측, 우측으로만 나누어 절단하던 중 위 259kg 상당의 철근콘크리트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판결문 中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I씨에게 작업계획서도 없이 구두로만 작업 내용이 전달됐다.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하게 되면 무거운 철근콘크리트가 떨어져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다.
피해자 I씨는 정상적인 작업 방법을 숙지할 수 없었고, 사고가 발생했다.
그뿐 아니라 이동식 비계 꼭대기에 추락을 방지할 안전난간도, 이동식 비계의 넘어짐이나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바퀴 고정도 없었다. 하청업체C는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만 안전 난간대 미설치를 두 차례나 지적받았다.
어느 하나라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피해자 I씨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미와 한계
발주사는 어디에?
공사를 의뢰한 원청사의 책임은 판결문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은 “교육청에 미리 수정할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콘크리트 작업이 다 끝난 뒤에 1층 내부 출입문을 넓혀 달라고 요청이 왔다. 그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하청업체C)는 것이다.”
이 공사 현장은 발주처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피고인 하청업체 C 60%, 그리고 별도의 업체 H주식회사에 40%의 공동으로 도급을 받은 현장이다.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받는다. 하지만 발주처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에서 예외가 된다.
증거 은폐 시도에도 참작?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도 유족 합의, 피해자 과실이 참작 사유에 포함됐다. 벌금형이 두 번 ‘밖에’ 없다며 참작 사유가 되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증거 은폐를 시도해도, 자료를 꾸며서 제출해도 가중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참작 사유가 됐다. 사고가 나기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에서조차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피고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판결문 中
그뿐 아니라 법원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보았고, 이조차도 현장 노동자들에게 배포되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노사협의체에는 임원들의 이름이 올라있었고, 법원은 정기 회식 등을 의견 청취와 반영을 위한 절차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꾸미기 위해 노력한 것에 불과하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