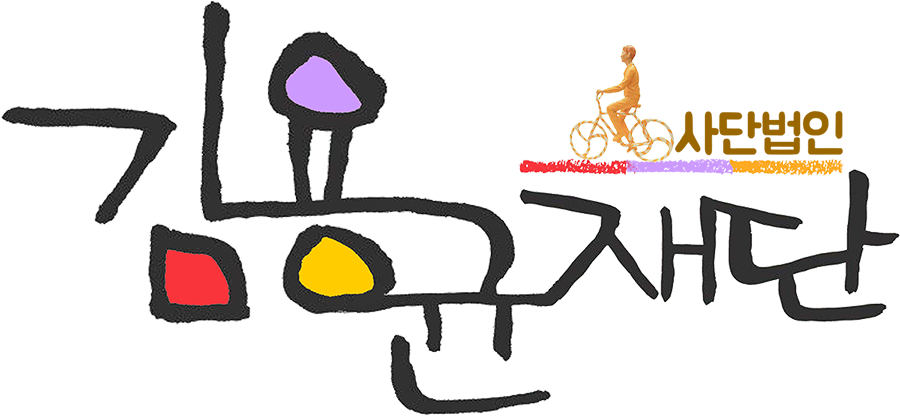*사진; 노동과세계 변백선
12월 8일 진행한 고 김용균 1주기 마석모란공원 추도식의 두번째 발언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소장 추도사입니다.
————————————————
1년이 지났습니다. 노동자 김용균이 일하다 숨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산재 노동자 김용균 추모하는 자리에 서서 그가 떠난 지난겨울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김용균은, 노동자들은 캄캄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컨베이어의 압도적인 속도와 굉음, 탄가루로 자욱하여 한치 앞도 제대로 분간키 어려웠던 그 지옥도와 같은 일터에서 홀로 일하던 하루하루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캄캄하고 두려웠습니다. 그가 갈가리 찢겨 일터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것 만 같았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끼어서 숨진 열아홉 살 구의역 김군을 보내며 시작되었던 산업안전법 개정 요구들은 24건이 넘었지만 차곡차곡 쌓여 묵혀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에 끼어서, 조선소 크레인에 깔려서, 소화기 약제를 충전하다가, 도금조에 화약약품을 넣다가 그렇데 노동자들은 계속 죽고 쓰려져 갔지만, 법 개정은 지체되고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일터의 안전은 삶이자 생활의 영역이지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법률과 제도들이 결정되는 것은 오롯이 정치의 영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김용균이 죽어간 것입니다.
노동자들 특히 소규모 사업장,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더 많이 상하고 더 많이 다치더라도 당사자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파견 책임자 혼내고 정규직 전환은 직접 고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이제는 영정으로 남은 사진 속에서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것이 그를 포함하여 위험한 현장에서 필사의 노동을 수행해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참여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죽음에 이르러서야 노동자의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러도 기성정치는 납치범들이나 할 만한 목숨값 흥정을 벌이거나 야당 탓 여당 탓에 바빴습니다. 기업의 입장,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만이 관심이 되어 무능한 정치와 함께 제도는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의 실종은 어머니를 한겨울 길거리로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캄캄한 작업장에서 김용균이 의지했던 휴대폰 불빛처럼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고 그 해 온 겨울을 달구어 결국 2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습니다.
김용균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이라 불렀던 이유는, 그의 죽음을 계기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2의 김용균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문송면을 호명하는 것은 황유미를, 김용균을, 김태규를 호명하는 것은 기억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 불러지는 노동자들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이라고 부르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외동아들의 죽음에서 각성하여 위험한 일터에서 아슬아슬한 노동을 이어가는 모든 노동자들의 부모 마음을 대변하여 지난 온 겨울을 거리에 섰던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자리는 김용균을 추모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우리들의 다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세워야겠습니다. 그 법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기업살인법이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든 바로 세워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또 다른 노동자들을 호명하고 추모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일간지의 한 면을 빼곡히 채운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떨어지고, 물체에 맞고, 깔리고, 뒤집히고, 끼여서 사망한 1,200명의 노동자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생명하나하나가 온 우주와 같으니 산재사고 사망자 몇 명, 숫자가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를 새기고 기억하고 환기하고 죽음의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막기 위한 여정에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맞서야 할 것입니다.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발전기를 돌리고 도시를 밝히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하청의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의 뼈와 살점을 반죽하여 건물을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거름으로 농작물을 길러내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노동자들의 목숨과 위험의 대가로 쌓인 이윤을 아무런 책임 없이 걷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정부가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했었습니다.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여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파견이나 용역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겠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령들은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고, 노동법 개악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주 52시간 노동은 탄력근로제 완화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특조위의 제안은 단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용균을, 일터에서 쓰러진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방식은 때로는 간절한 염원이기도 할 것이며 법제도 개혁과 그것을 담당해야할 정치와 관료에 대한 집요한 추적이기도 할 것이나, 대부분은 가열 찬 투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김용균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도 노동자들의 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김용균의 이름을 빌린 법과 제도들을 제대로 세워 그대 영혼의 잠자리가 방해받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사진; 노동과세계 변백선